
천식이 심한 체 게바라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8개월의 긴 장정을 마쳤다. 남미 여행은 체 게바라를 혁명의 용광로로 밀어 넣게 한 촉진제였다. 5년 전 오토바이 여행 답사하기 위해 1박 2일 필리핀 섬을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는 동안 체 게바라가 떠올랐다. 좋은 여행은 통찰을 안겨준다. 2014년 동료교사와 함께 떠났던 라오스 18일 자유여행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의심하게 했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준 여행이었다. 이제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다큐 <칠레 전투>의 첫 장면은 모데나 대통령궁이 쿠데타 세력(군부정권 독재자 피노체트)의 전투기에 폭격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치 헛된 수작은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수 우파의 매서운 공격은 1970년 칠레에서 평화적인 과정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회주의 대통령 아옌데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아엔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평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데자뷰다) 보수 우파의 반혁명 공세와 춘추전국 시대처럼 즐비한 정당의 권력 투쟁 속에서 아옌데는 힘겨운 사회주의 개혁을 단행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군인 보수우파의 거센 반동을 맞게 된다. 30대 초반 시네마테크 사무실에서 저화질의 복사판 비디오로 봤던 다큐였지만 사회주의 대통령 아옌데 정권의 몰락은 고화질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혁명은 2G처럼 버퍼링이 심하다. 2002년 진보정권의 도전과 실패는 수구 세력의 반동을 강화시키고 반동의 파도는 몹시도 거칠었다. ‘무한경쟁’과 ‘헬조선’이 난무했다. 심지가 약한 초식동물들은 버티기 어려웠다. 당파성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의 시스템. 그래서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달동네 서민이 정주영과 정몽준을 찍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지 못하는 건 주체를 내면화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타자화 시키는 노예식민 교육의 프레임도 한몫한다. 그래서 깨어 있는 주체가 되는 교육이 전제없이 성큼성큼 질러가는 혁명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칠레 전투>에서 아옌데의 희망은 아름다웠지만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혁명은 깃발만 나부낄 뿐이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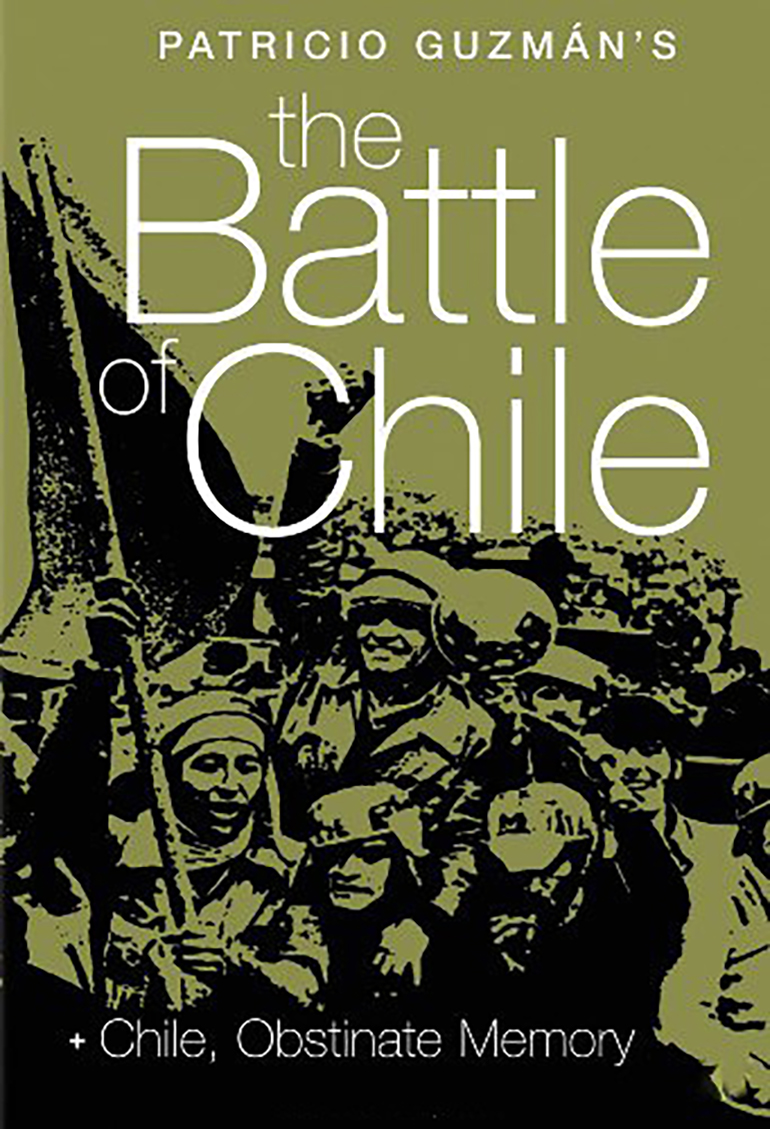
다큐 <칠레 전투>의 제작과정은 아옌데 정권의 운명처럼 쉽지 않았다.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을 위시한 칠레의 젊은 영화인 다섯 사람은 조명 장비 조차 제대로 없이 달랑 카메라 하나만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그 삼년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은 수도 산티아고에서부터 광산과 시골의 농장에 이르기까지 칠레 전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칠레의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겼다. 갑작스런 쿠데타에 이들은 기록된 필름을 6개월에 걸쳐 쿠바로 밀반출하고, 이어 망명까지 한 끝에 1979년에야 편집을 마쳐서 영화를 완성하게 된다. 제1부 ‘부르주아지의 봉기’(98분) 제2부 ‘쿠테타’(87분) 제3부 ‘민중의 힘’(79분)
<백운의 여행이야기>에서 일부 인용

아무리 생각해도 쿠바에서 나와 콩고와 볼리비아의 밀림을 선택한 체 게바라의 선택은 무리수처럼 보인다. 죽음을 각오한 팔레스타인의 자살특공대나 다름없었다. 볼리비아에서 사살 되기 직전까지 체 게바라의 무모한 도전의 실마리는 최근 넷플렉스에서 본 <쿠바 리브레>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체게바라의 죽음은 혁명을 가장한 위선적인 권력자들의 저열한 욕망에 그리고 수구세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 *‘불가능한 꿈’을 잊지말라는 상징적인 행위이자 경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게바라 자서전 앞장에 나오는 구절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오아시스 (전주 야호학교 교장/양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