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격리 덕분에 명불허전의 작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영화는 두 번 볼 때 발견 된다’. 인간의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기에 최소 두 번은 봐야 작품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의 영화 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고전 영화를 많이 보는 바람에 올해의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영화들은 단지 못 봐서 포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 영화 중 별점 4개 이상의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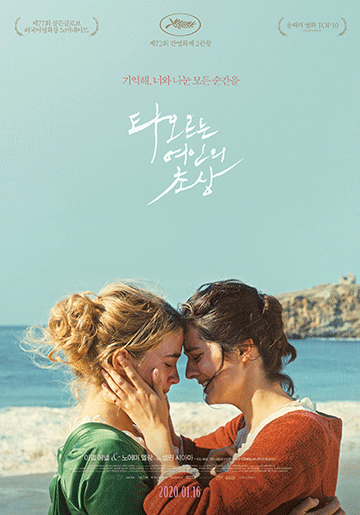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마리안느는 외딴섬으로 간다. 초상화 작업 과정을 통해 눌렀던 욕망들이 일어나고 서로는 의미심장한 관계로 발전한다. 지속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를 스크린에 담아온 셀린 시아마 감독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역사 속에서 존재가 지워진 여성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며 그동안 남성 중심의 서사로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화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두 교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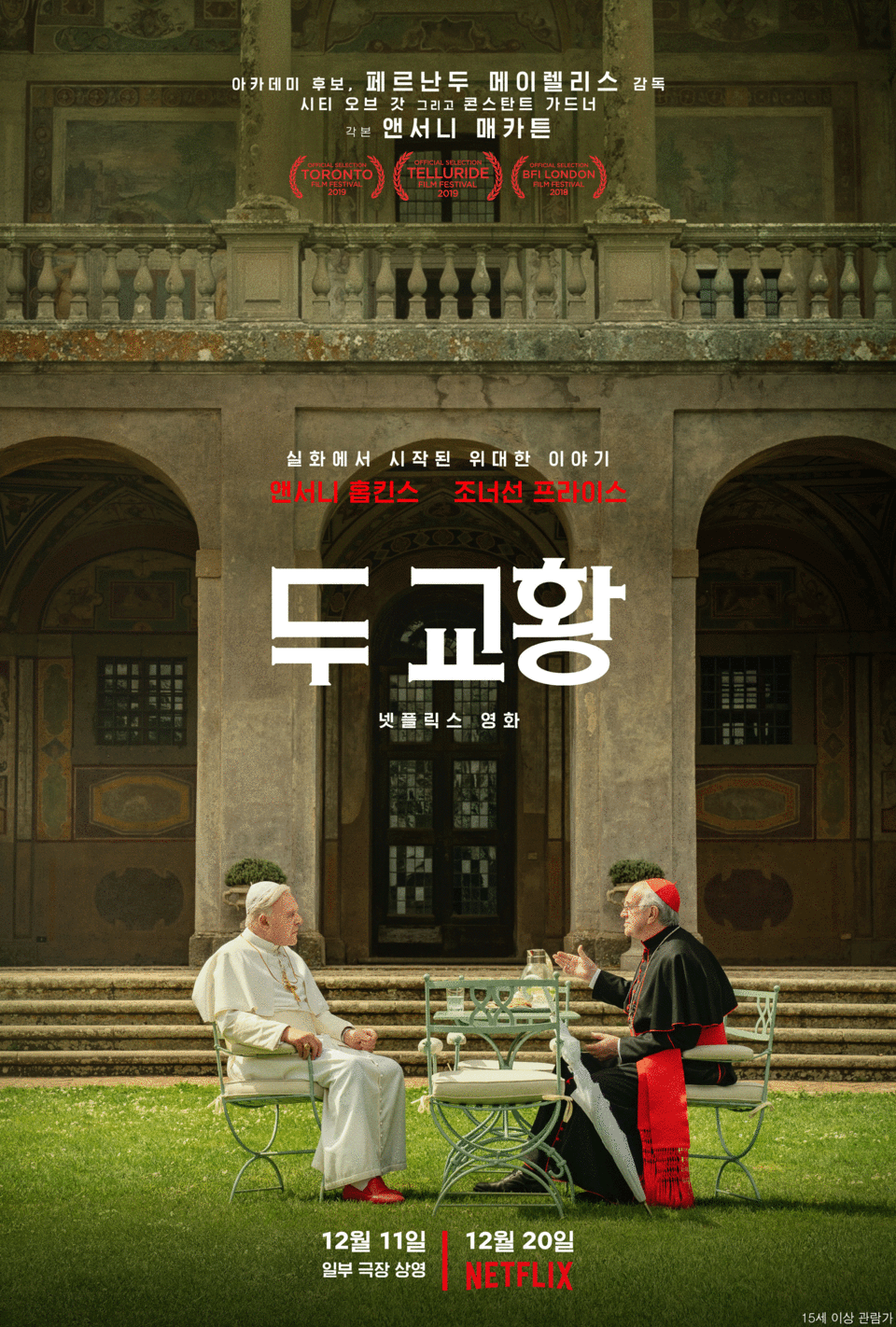
종교 영화는 의도가 확실해서 상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대상도 한정적이다. <두 교황>은 실존하는 교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기록과 함께 종교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노골적으로 신을 강조하는 기존 종교 영화보다 훨씬 더 메시지가 강력하다.
작가 미상

히틀러가 지배하던 파시즘의 시절에 유태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수용소로 보냈다는 역사적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열등한 국민들은 지워버리고 싶었던 게다. <작가 미상>은 현대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삶을 옮겨 논 영화다. 리히터는 사진을 캔버스에 그대로 모사한 뒤, 넓은 붓으로 다시 뭉개서 흐릿하게 만드는 기법인 ‘포토 페인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전체주의의 폭력에 지워질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위기를 묘사하고 싶었던 걸까?
환상의 마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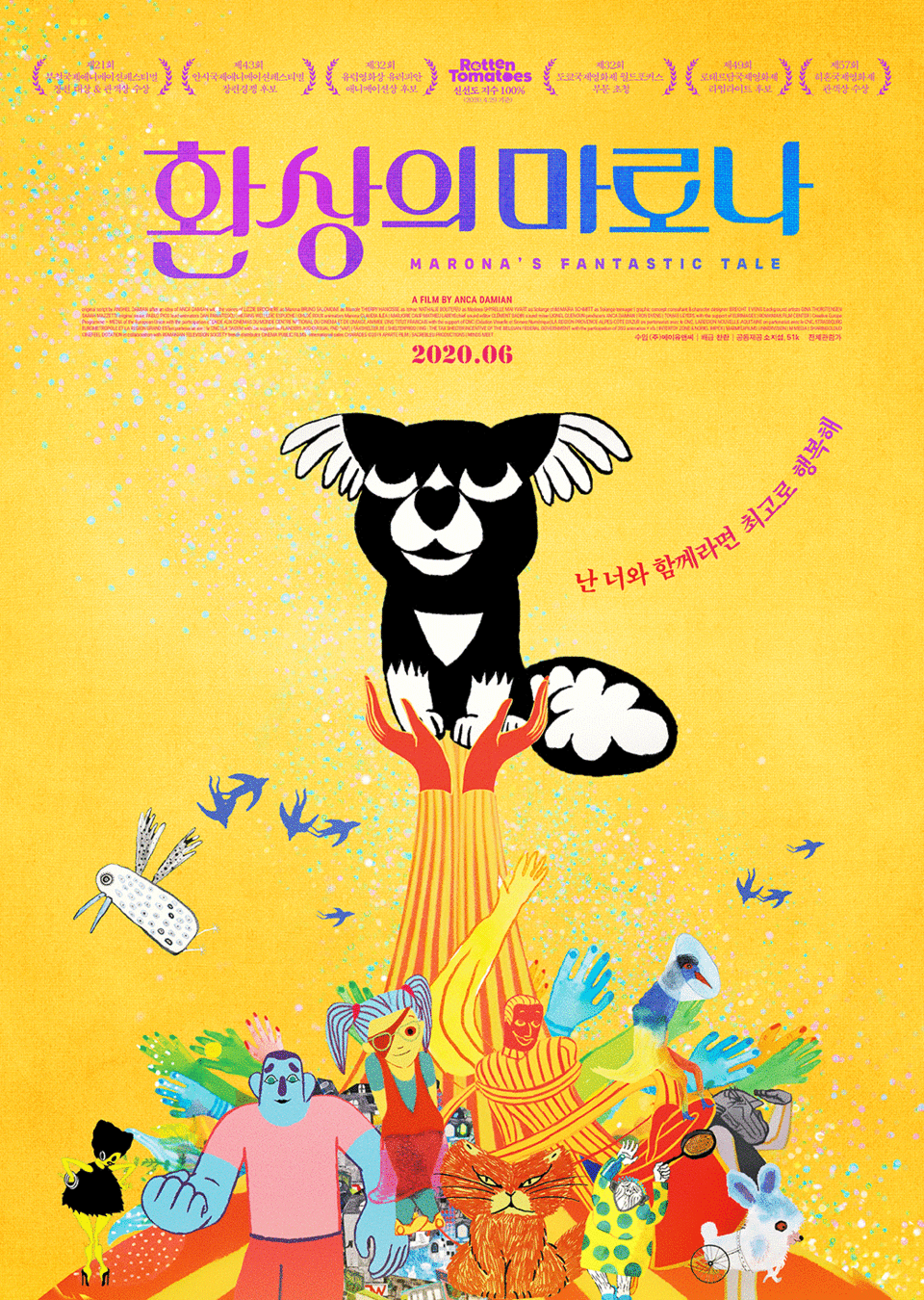
<환상의 마로나>는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가족영화나 아동물의 규격 밖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최근 <러빙 빈센트>가 유화로 90분을 채우는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면 <환상의 마로나>는 추상 회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움직이는 퍼포먼스다. 마치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춤추면서 넘나드는 그림 뮤지컬을 보는 거 같다.
교실 안의 야크

<교실 안의 야크>는 담백하다. 호주로 이민 가고 싶은 교사 우겐은 의무적인 경력 기간 6개월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4800m의 오지마을에 갔다가 주민들과 벌어진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다. 영화 초반 마을까지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무려 20분을 묘사한다. 도시 교사와 시골아이들의 만남은 <선생 김봉두>처럼 묘사하기 십상이지만 영화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쉽게 연민을 요구하거나 공동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교사는 미래를 어루만지다’는 마을 촌장의 말처럼 영화는 코로나에 지친 관객을 어루만졌다. 군더더기 없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숏들의 산맥이 히말라야처럼 이어진다. 큰 스크린으로 봐야만 제대로 산악국가 부탄의 미장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2020년에 만난 명불 허전의 영화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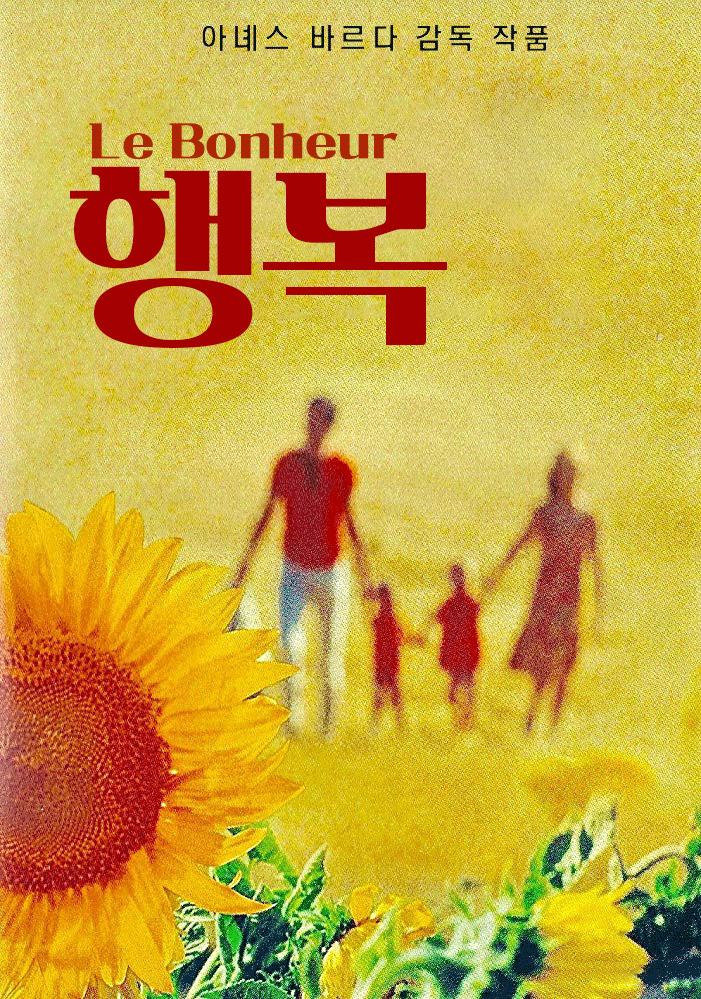
아내 테레즈의 갑작스런 침묵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념과 가족제도의 메커니즘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들.

터질만한 곳에서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여인의 인내심이 오히려 더 무섭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성의 존재를 짚어주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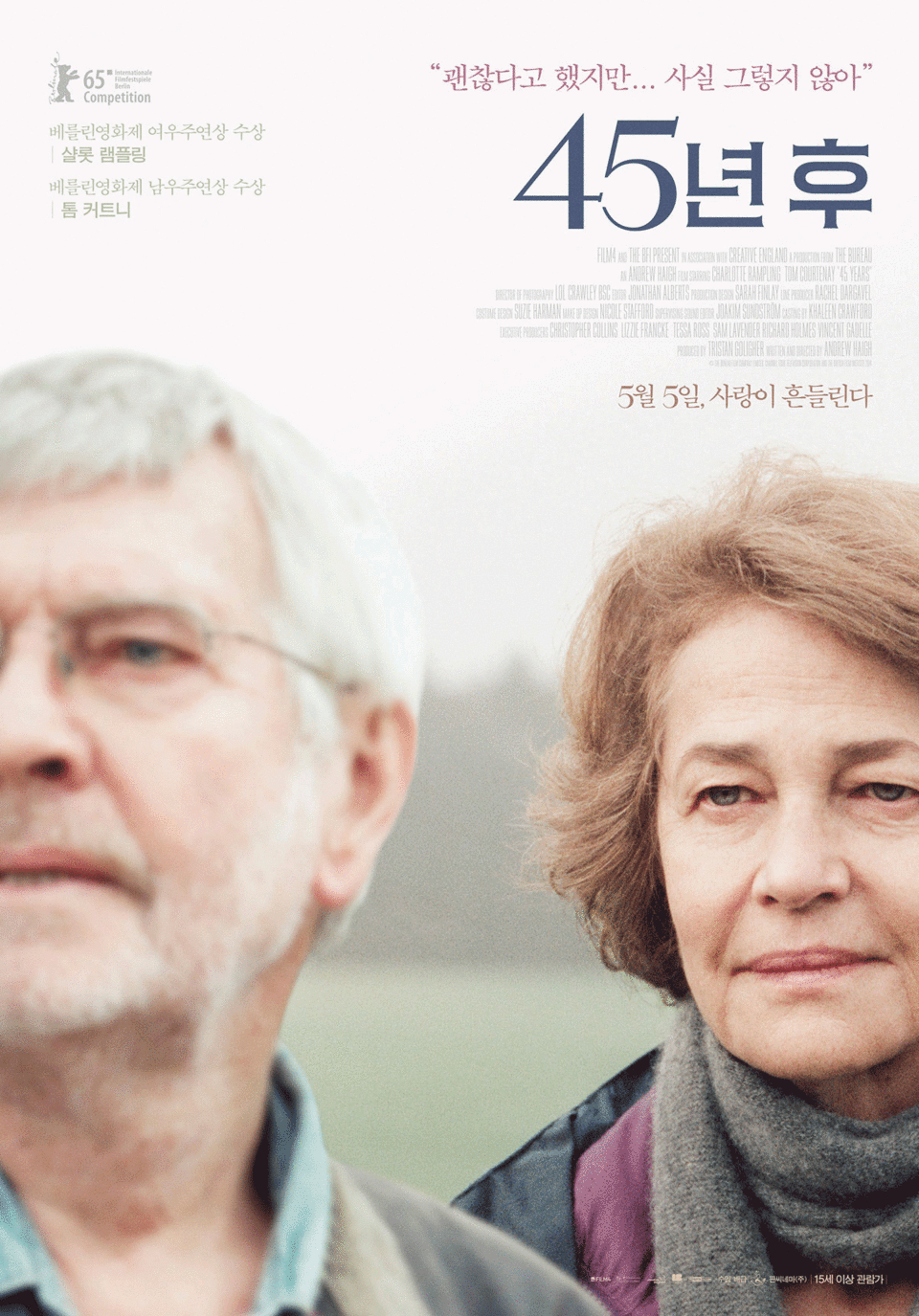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서적 수용은 45년을 부부로 지내도 어려워.

일상의 균열이 공포스러운 남자와 일상의 반복이 공포스러운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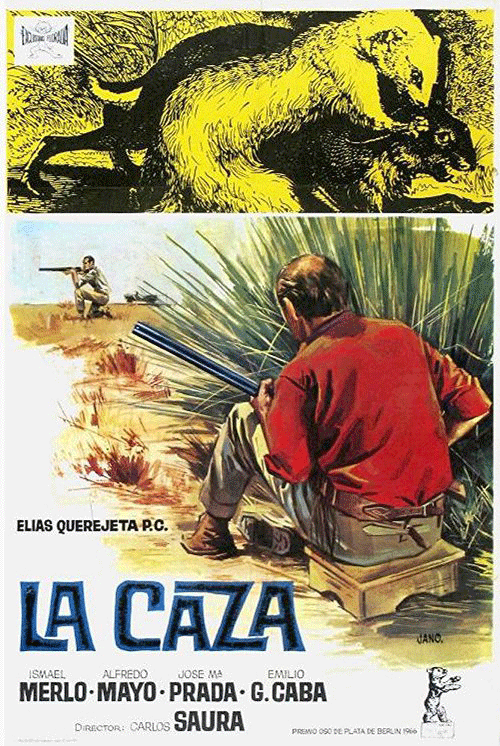
뜨거운 햇빛과 더위가 사냥의 표적을 바꾸었다. 까뮈의 <이방인>이 떠오른다.
* 2020년에 만난 명불허전의 영화들 2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