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월전리 배정안 어르신(1951년생~)
동네 어귀에 이르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감나무 한그루씩 마당에 품고 옹기종기 앉은 담장 낮은 집들이 정겹게 먼저 반긴다. 그 골목길을 돌아서자 반듯한 하얀 집이 눈에 안긴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에 걸친 감나무엔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홍시의 날을 기다리며 현관을 벗 삼아 흔들고 있었다. 살가운 주인의 손길을 많이 탄 듯하였다.

■ 무쇠처럼 살았던 신혼 시절
내 고향은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다. 친정집은 유년 시절 대전시 태평동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8남매를 두셨는데 나는 네 번째로 태어났다. 형제가 많아서 클 때 까지 나는 거의 집안일도, 밥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다. 부자는 아니었어도 친정 품은 너무 포근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소일하던 중 남편의 누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였다. 내 나이 24살 때였다. 남편은 서른이 넘은 노총각이었다. 당시 시댁은 동네에서 몇 안 되는 기와집이라 부자소리 듣던 집이었다. 시집와서 보니 내가 챙겨야 할 식구는 열 손가락을 다 꼽아야했다. 시부모는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당시 100여명 정도 되는 놉을 사서 모내기를 할 만큼 꽤 큰 농사를 지었다. 시집 올 때는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호강만 할 줄 알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 많이 했다. 농사 많은 집에 시집오면 마님소리 들을 거 같지만 신세는 고달프다. 뒷짐 지고 물끄러미 일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욕먹기 십상이고 더 많이 가진 자의 자세도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뒤돌아서면 자라는 풀들도 웬수처럼 보였다.
나는 2남 1녀 자식을 두었다. 머슴도 두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도련님 소리 들으며 자랐다. 시집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찔하다.
“내가 세상천지 밥을 해봤어야지. 시집와서 갑자기 100명 놉에게 새참까지 하루 5번의 엄청난 양의 밥을 해서 나르는 일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어. 어린자식들 챙기면서 집안일 하랴 밥하랴 농사일 하랴 어휴 그때를 생각하면 허리 펼 날이 하루도 없었지. 시동생들도 한창 힘을 쓸 때라 국수를 삶아도 1관 짜리 사서 끓였는데 어찌나 잘 먹던지. 아침이면 스대발씩 느대씩 밥을 해서 도시락도 7개나 싸던 때였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그렇게 몇 년간 놉의 밥을 하다 보니 나중엔 꾀가 생겨서 아예 큰 가마솥을 논둑에 갖다 놓고 밥을 해댔어. 집에서는 동태 탕을 한 솥단지 끓이고, 오이 무치고 다른 것 몇 가지 해 갖고 나가곤 했는데 한결 수월해져서 견딜만했었지.”
남편은 2,3년 정도 농사일을 거들다가 공무원시험을 보고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다. 결국 농사일이 오롯이 내 몫이 돼 버렸다. 그러던 중 막내아들이 3살 때 쯤 인가 시아버님마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집안 살림이며 농사를 다 짊어 질 수밖에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나무땔감까지 하러 다녔다. 게다가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지게지고 가서 나무를 싣고 왕복하며 매일 다녔다. 나중에는 동네 부녀자들끼리 리어카를 끌고 2인 1조가 되어 밀고 끌며 농사일 없는 시간에 나무를 하러 다녔었다. 한 15년 나무일을 했다. 힘든 모습을 보아선지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다. 내가 나무를 하러가는 날이면 큰 딸내미가 나대신 시아버님 식사를 챙겨주곤 했다. 한 번은 딸내미한테 시아버님 밥 차려 드리라고 부탁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국민학생 딸이 엉엉 울고 있었다. 키 높은 찬장에 있던 그릇을 꺼내다가 깨뜨려서 놀랬던 모양이다. 애미가 안팎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어린 딸한테 내 몫까지 시켰더니 마음고생만 하게 했다. 우리 미정이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큰딸은 어릴 때부터 남동생들 다 챙기며 나를 많이 도와줬다. 큰 딸은 살림밑천이라더니 기특했다.
어르신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고생스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쁜 웃음까지 지으시며, 자식 얘기 할 때는 얼굴에 행복 꽃이 마냥 피어났다.
■ 물 흐르듯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이여
5년 전에 기와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 춥게 살아도 절 마냥 튼튼한 나무로 지어진 기와집이라 못 고치고 살았는데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막내아들 권유로 새로 지었다. 손주들까지 몰려와도 덥거나 추울 걱정 없는 집이라 고대광실(高大廣室) 안 부럽다.
지금도 열 마지기 좀 안 되는 벼농사를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고구마 농사도 조금 짓고 있는데 재미가 있다. 올해는 고구마가 제법 튼실하게 나와 50상자 정도 수확했는데 장에 나가 팔기도 하고 지인들이 사주기도 했다. 두루두루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해마다 내 생일 때면 며느리는 꼭 미역국을 끓여온다. 딸내미는 잡채, 부침개 등을 준비해서 가져온다. 형제간에 의논해서 요모조모 챙겨오는 우애가 들고 오는 음식보다 더 큰 선물이다. 우애 있는 모습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없다.
특히 우리 손자들은 내가 미역국을 끓여 줄 때
“할머니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귀에 달짝지근한 얘기를 하고 남은 미역국을 싸달라며 바리바리 챙겨간다. 손주들한테는 뭐라도 다 퍼주고 싶다. 특히 손주들한테 맛있다는 칭찬받으면 우쭐해진다. 내리사랑은 어쩔 수 없나보다.
몸은 아직도 바쁘지만 나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야지. 생활은 남편 연금에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우리 부부의 삶은 팍팍하지 않다. 시부모 용돈 고박꼬박 챙겨주는 우리 며느리들 덕분이다. 시골 사는 우리부부 자존심도 지켜주고 다시 손주들에게 이런저런 구실로 선물하고 돌려 줄때는 받는 기쁨의 갑절이다.
몇 년 전부터 남편과 1년에 한 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다. 올해도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다. 정말 좋았던 나라는 캐나다와 태국여행이었다. 특히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바라본 놀라운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다. 작은 시골마을에 살던 우리가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는 건 즐거움을 넘어 축복이었다.
나는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다. 집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남편이 내 기사노릇을 자처하고 매일 태워다 준다. 난 괜찮다고 하지만 남편은 흔쾌히 핸들을 잡는다. 금슬이 좋다고 해야 하나 하하.
어르신은 집하장에 모여 있는 동네 분들에게 고구마 간식을 챙겨줘야 한다며 햇살 같은 웃음을 던지고 총총 걸음을 옮기셨다. 소소한 추풍 한 자락이 담장을 스치며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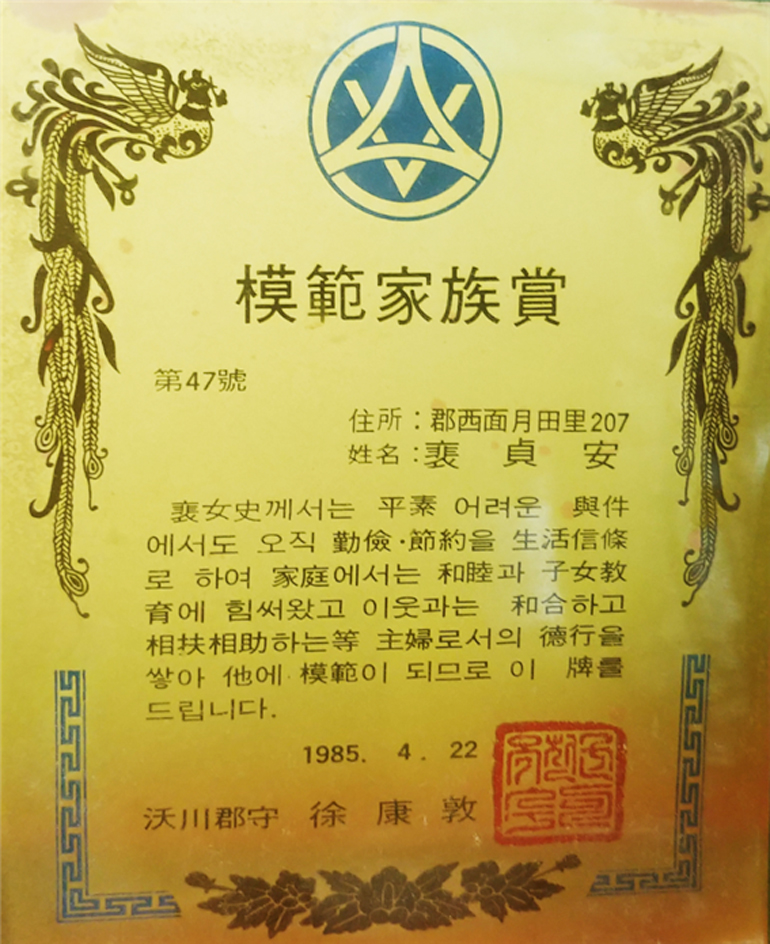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