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래 (금산 간디학교 교사)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 안토니오 알타리바 / 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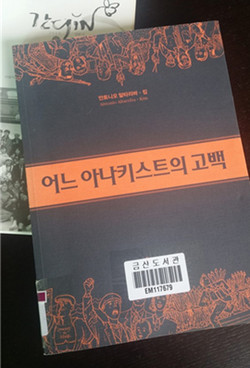
“내 아버지는 2001년 5월 4일에 자살했다.”
책은 이런 충격적인 말로 시작한다. 1910년에 태어났으니까 90살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는 오래 지냈던 양로원 5층에서 뛰어내렸다. 죽음에 임박하면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한다. 그것에 착안한 듯 이 책은 그가 5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지상에 닿는 짧은 순간,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어쩌면 그 시절 스페인 사라고사(Zaragoza; 스페인 서북부의 도시이며 바르셀로나의 왼쪽에 있다) 인근의 시골에서 태어난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스페인 근대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보여준다. 아들인 저자는 그를 아나키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젊은 시절은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시골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핍박받으며 뼈빠지게 일하느라 사라고사로 도망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동차(특히 ‘이스피노-수이자; 1904년에 설립된 스페인 자동차 회사’)와 운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막연하지만, 더 좋은 세상과 평화를 꿈꾸었다. 당시 농촌의 가난과 결핍이 가슴 시리게 그려진다.
20대부터는 전란에 휩싸인다. 재봉틀(그 유명한 ‘SINGER’) 영업 일을 하던 중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프랑코 군에 징집되지만, 탈영해서 구사일생으로 공화군 민병대에 합류한다. 여기서 일생의 아나키스트 동지들을 만난다. 운전병으로 전장을 누비다가 패해서 난민으로 프랑스에 수용된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상황이기에 프랑스도 난민을 돌볼 여유가 없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한다.
프랑스 시골에서 그는 행복에 눈 뜬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나키스트 동지와 프랑스에서 미군의 물자로 석탄 사업을 하다가 프랑코 독재 하의 스페인으로 돌아간다. 그는 전쟁 없는 시대를 살게 되지만, 독재 체제 하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혼은 나에게 있어 일종의 죽음과 같았다... 그동안 지켜왔던 자존심과 사상을 매장시키는 일이었으니... 하지만 새로운 삶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많은 스페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시체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P141
이후 중장년은 평화보다는 안위, 나라보다는 가정을 살피는 삶이지만, 허전하고 길을 잃은 삶이었다.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삶은 생기를 잃어간다. 양로원에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독립운동가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독재 정권과 민주화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아흔 살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온몸을 던져 추구했던 가치가 허망하게 느껴질 것 같다. 특히 요즘 세상엔 더 그렇지 않을까? 이 풍요로움 속의 빈곤함, 버려진 듯한 느낌.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열패감 같은 것이 이 그래픽노블에 진하게 묻어난다.
힘든 시절이었다. 내 할아버지 세대의 고단한 삶이다. 이때는 ‘삶이란 고통이다’라는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을 것이다. 해야 할 것, 응당 그래야 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
스페인은 다른 유럽 선진국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현대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이다. 프랑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히 편안함을 느꼈는데 싼 물가 덕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